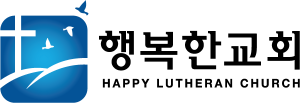손잡아야 살아남는다.
나는 미국 어느 인디언 보호 구역의 학교에 새로 부임한 백인 교사의 일화를 늘 가슴에 품고 산다. 시험을 시작하겠다고 하니 아이들이 홀연 둥그렇게 둘러앉더란다. 시험을 봐야 하니 서로 떨어져 앉으라고 했더니 아이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이렇게 말하더란다. “저희들은 어른들에게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상의하라고 배웠는데요.” 우리 중에는 철저하게 혼자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늘 여럿이 함께 일한다. 대학의 문을 나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거의 모두 협업 현장에 던져지건만 학교 체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철저하게 홀로서기만 배운다.
나는 이 같은 홀로서기 교육의 배경에는 생물학자들의 죄가 크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우리 생물학자들은 자연을 그저 생존 투쟁과 양육강식의 세상으로만 묘사했다. 다윈이 앨프리드 윌리스의 종용으로 도입한 하버트 스펜서의 그 유명한 표현 – 적자생존 Survival or the fittest – 은 최상급이 아니라 비교급인 Survival or the fitter여야 했다. 다윈의 자연선택론은 철저하게 ‘상대성’이론이기 때문이다. 자원이 풍족하면 아무도 도태하지 않는다. 자원이 부족해지더라도 최적자(the fittest)만 살아남고 모두 사라지는 게 아니다. 부족한 만큼 경쟁에서 뒤처진 일부가 사라질 뿐이다. 자연에서나 우리 삶에서나 꼴찌만 아니면 솟아날 구멍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2014년에 출간한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는 내가 동료 생물학자들을 대신해 써낸 사과문이다.
손을 잡으라고 해서 모두 한데 엉겨 붙자는 얘기는 아니다. 칼릴 지브란의 시 <결혼에 대하여>는 자연과 우리의 삶을 적절하게 묘사한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 말라
그보다 너희 혼과 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선 자랄 수 없다.
최재천, “숙론” pp.8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