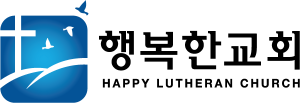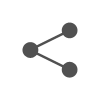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나는 부친을 ‘아빠’가 아닌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아마도 이 두 표현의 미묘한 차이를 인식했던 게 그때쯤 같다.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나는 왠지 ‘아빠’가 아닌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았다. 그리고 이 표현의 전환은 생각보다 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아버지’라고 부른 이후부터 그분과의 대화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분이 하명하시면 그저 들을 뿐이지, 내 생각이나 감정을 얘기해 본 적은 없었다.
옛 사람인 그분의 교육 방식은 일관성이 별로 없었다. 또한 예전 목사님들이 그러했듯, 신앙적 이유로 모든 동시대적 문화를 금하셨고, 게다가 돈마저 없었기에 요청하는 모든 것들은 당연히 거절당했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턴가 요청 자체를 하지 않게 되었다. 거절이 두려웠다. 그렇게 내게 아버지는 일종의 무서운 감시자이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분이었다. 그런데 보통 자기 아버지에 대한 감상이 하나님 아버지라 불리는 분에게도 고스란히 전이되기 십상이다. 나 역시 그러했다.
시간이 꽤 흐른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 내 아버지상과 하나님 아버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언젠가부터 아버지가 보여 준 거칠고 투박하게 느껴지던 그것이 그분의 시대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한계 아래 이루어진 사랑일 수 있겠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도 본인의 아버지에게 받은 게, 혹은 본 게 그것밖에 없어서라는 것을 인정했다. 여전히 동의되지는 않으나, 그분의 마음 자체를 더 이상 의심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랑도 완벽한 대칭을 이루지는 못한다. 그런 사랑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랑은 애초부터 비대칭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이 틀림없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그러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그러하다. 부모된 이는 자나 깨나 자식 생각이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만큼 잘해 주지 못하고, 늘 미안할 뿐이다. 그런데도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표현이 늘 거칠게 느껴지고,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는지 의문일 뿐이다. 형제자매의 사랑 역시 매한가지이다. 인격적 사랑을 하기에는 어려서부터 너무 많은 사연이 얽혀져 버린 경우가 많다. 원하지 않았으나 이미 매겨진 서열에 의해 차별받기도 하고, 불필요한 짐을 짊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릴 법한 ‘가족’은, 어쩌면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이기도 하다.
손성찬, “사랑하느라 힘든 당신에게” pp. 135-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