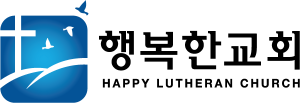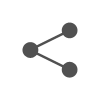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죄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열매를 먹는 순간 스스로를 도덕적 잣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척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재단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강도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망치로 달궈진 쇠를 두드려 펴는 삶’입니다. 그는 여관주인 노릇을 하면서 묵으러 온 손님들을 자기 철 침대에 눕게 한 다음, 그 사람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잘라내고 작으면 망치로 두드려서 늘이는 방법으로 상대를 살해합니다. 철 침대가 모든 인간을 재는 척도 혹은 기준입니다. 그는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동일성의 폭력입니다. 그 침대에 딱 맞는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는 길이를 조정하는 장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침대에 눞혀지는 순간 살아서 내려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이런 괴물 같은 인간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화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읽히는 것은 그 신화가 인간의 원형적 경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이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야.’ 우리 속에 상처가 많은 것은 이런 괴물들이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할 생각이 없는 동일화의 욕망은 폭력입니다. 차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입니다.
김기석, “고백의 언어들” pp.91-92